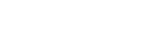|
| 임시서고_앞_휠체어 |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물 열람에 있어 장애인 접근권 보장 현황과 계획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난 해외입양인들은 이제 성장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끊어진 삶의 서사를 복원하고자 자신의 입양 당시의 기록을 찾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864명에 의해 3374건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다. 그런데 그 뿌리찾기의 그 유일한 실마리일 수도 있는 입양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장애를 가진 입양인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올해 7월 19일부터 입양정보공개청구와 입양기록물 관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맡고 있다. 2023년 7월, 그간 민간에서 주도해온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나 입양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입양기록물 열람은 어떤 면에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이다.
입양기록물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기록물 임시서고에, 사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서울 보장원 본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 방문 예약부터가 난관이다. 임시서고 또는 보장원 본원 방문은 일주일 중 3일(화, 수, 목), 하루에 3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자는 월 평균 150명이 넘는데, 기록물 열람을 위한 방문은 일주일에 9명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방문 예약은 보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하여야 하는데, 이 웹사이트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 인증(WA 인증)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오류가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해외입양인들은 국문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수 없어 영문 웹사이트로 로그인해야 함에도, 웹사이트 제작상의 오류로 영문 웹사이트에서는 방문 예약을 할 수 없었던 등이다. 40일 동안 방기되던 이 문제는 김예지 의원실에서 문의하자 고쳐졌다.
예약에 성공하더라도 장애인이 임시서고에 접근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 지난 7월 보장원이 공개한 입양기록물 보관소는 한 냉동 물류창고 4층에 자리잡은 임시서고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이 임시서고는 지하철역에 내려서도 버스를 타고 2~30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 자리해 있다. 또한,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며, 경사로 각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해외입양이 본격화된 1958년부터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써온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간 공식 추산 약 17만 명의 아동을 해외에 입양 보냈고, 그중 4만여 명은 장애아동이었다. 따라서 장애입양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은 필수적이다. 아동권리보장원 한명애 본부장은 “몸이 불편한 해외입양인은 서울에 있는 보장원 본원에서 기록물 사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사본은 보관된 기록물 중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양인들의 입장이다. 한 입양인단체 관계자는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 서류나 배냇저고리 같은 기록물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기록원과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정보공개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위탁 보존할 계획을 발표했다. 열악한 상태의 임시서고를 보고 국가기록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덕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더라도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점자・음성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어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마련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온 해외입양인들에게 입양기록물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근거”라며, “국가가 입양에 관한 책임 강화를 선언했음에도 턱없이 미비한 준비로 입양인들에게 거듭 상처만 안겨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당사자에 대한 열람권 보장을 국가의 엄중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정보공개의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직접 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시설은 물론 국가기록원의 자료에도 모두의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